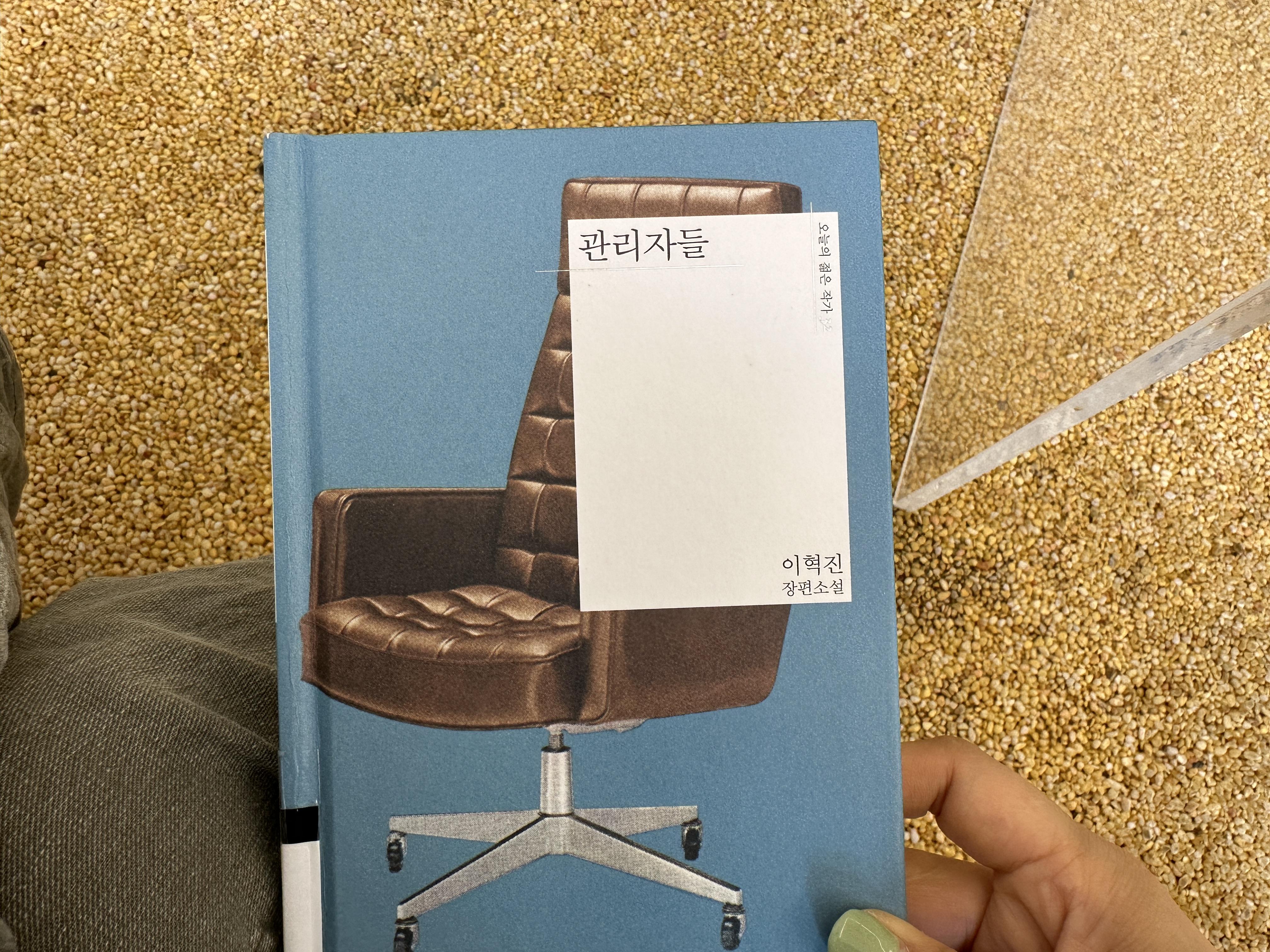
소설 [관리자들]은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 이혁진 작가의 책이다. 이혁진 작가는 낯설었는데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인 [누운 배]와 드라마로도 제작된 [사랑의 이해]를 쓴 작가다. [관리자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관리자와 관리를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담았다.
[관리자들]의 줄거리
[관리자들]의 중심이 되는 배경은 공사 현장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그들의 관리자가 주인공이다. 그들이 일하는 현장은 혁신도시에서 해안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콘크리트 하수관을 놓는 공사였다. 공사가 신규 국도로 이어지는 중간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서로의 입장차가 드러난다. 반장은 구간이 수월해 설렁설렁 작업해도 밥값이 나오는 구간이라 여겼고 소장은 반년이상 밀린 공기를 만회할 시작점이라 여긴 것이다. 소장은 보는 눈도 없는 이 구간에서 날림공사를 요구한다. 안전사고 예방이 주 목적인 흙막이 공사를 생략시킨다. 게다가 함바집 여사장과 짜고 부식비 중 일부를 빼돌린다. 불경기다 보니 타 지역에 넘어오면서 출혈하게 된 물류, 자제, 인건비 등을 쥐어짜 내야 했던 탓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인부들에게 돌아가고, 현장 일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선길이 있지도 않은 멧돼지를 잡기 위해 밤 보초를 선다.
사건의 절정은 성실히 밤 보초를 섰던 선길이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진다. 아들의 수술이 잘 되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 부여가 된 선길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현장 인부들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선길의 적극적인 활약은 돋보인다. 다만 현장은 밀린 공기 단축을 위해 더 빡빡하게 돌아간다. 인부들을 위해 하루만 쉬자고 반장들이 제안해도 소장을 꿈쩍 않는다. 오히려 반장들을 경쟁시키고 소장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은 반장들은 알아서 태도를 바꾼다. 결국 반장들은 소장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장 인부들을 달랜다. 현장이 어수선해지면서 인부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반장들의 감시를 피해 일과 중에 술판을 벌이고 슬렁슬렁 일하는 윤 씨 같은 사람과 매뉴얼대로 성실히 일하는 목 씨와 현경, 선길 같은 사람으로.
윤 씨 부류가 술판을 벌이는 사이, 묵묵히 일하던 선길이 사고를 당한다. 흙막이 공사를 생략한 구간에서 작업하다 구덩이에서 미끄러져 즉사한 것이다. 현경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며칠간 자리를 비운사이 현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러간다. 성실히 일했던 선길은 오히려 현장 분위기를 흐리고 음주를 하고 일을 한 나쁜 사람이 되어있다. 현장에 있던 어느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현경이 믿었던 목 씨 역시 소장의 회유에 넘어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결국 가해자가 되는 것은 피해자 선길이 었다.
[관리자들] 속 인상 깊었던 문장
다른 사람이 돼 보는 건 어렵고 타인에게 무심한 것은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부들이 선길의 인사를 무심히 받거나 이제 들어가 잠이나 자면 되니 좋겠다는 소리를 해대는 것도 그들이 특별히 야멸차거나 무정해서는 아니었다. 고생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각자의 고생이라는 생각에만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보듬고 다독인 경험도,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다.
타인이 되어보는 경험은 중요하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공감이란 것을 해야 하는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면 공감을 할 수가 없다.
한대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봐라, 너부터 당장 그러고 있잖냐. 책임은 지는 게 아니야. 지우는 거지. 세상에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거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멍청한 것들이나 어설프게 책임을 지네 마네, 그런 소릴 하는 거야.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자기 짐까지 떠넘기고 책임지라고 대가리부터 치켜들기나 하거든. 텔레비전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게 다 그거야.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거,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아예 안 만드는 거. 걔들도 관리자거든. 뭘 좀 아는."
솔직히 이 부분의 대사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소름 끼쳤다.
그렇게 일은 다시 소장의 뜻대로 흘러갔다. 반장들이 갈아서는 한 필승은 소장의 것이었고 사실 이제 소장은 좀 따분하기까지 했다. 어쩌면 저렇게들 뻔하고 뭘 모를까. 역시나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은 갈라 세우고 갈라 세우고 오로지 어떻게든 갈라 세우는 일이었다. 줄을 세우고 편을 갈라서 저희들끼리 알아서 치고받도록. 그러느라 뭐가 중요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도 못 하도록.
한마디 하고 싶다. 편 가르는 사람이 범인이다.
안전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두 그렇게 쓰거나 아예 안 쓰기도 했고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똑바로 썼더라도 작업 상태 때문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다. 선길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고 그렇기에 선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안일해지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있다. 누군가는 뭐라고 해야 한다. 누구라도 잘못된 상황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과연 나는 [관리자들] 속 누구의 모습과 닮았을까
전반부를 읽을 때는 조마조마했고 후반부를 읽으면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에도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회사의 입장에서 공기가 단가를 맞추어야 하는 소장이었다면, 인부들에게 하루 이틀 휴가를 주었을까. 인부들을 관리하는 반장 입장이었다면 다른 반과 늘 비교당하는 상황에서 꿋꿋하게 휴가를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현장의 인부 윤 씨였다면, 내가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분위기를 흐려 성실히 일한 그가 피해를 보았다고,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 현장을 목격한 목 씨였다면, 무리하게 일정을 잡고 억지로 일을 시킨 소장의 책임이라고, 선길은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 현장, 모든 인부들의 생계가 걸려있기에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믿는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리뷰]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_신예희작가 (4) | 2023.05.19 |
|---|---|
| [북리뷰]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_민음사, 김기창작가 (1) | 2023.05.18 |
| [북리뷰] 태도에 관하여_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2) | 2023.05.16 |
| [북리뷰] D에게 보내는 편지_앙드레고르 (12) | 2023.05.14 |
| [북리뷰] 다시 책은 도끼다_박웅현작가 (2) | 2023.05.13 |



